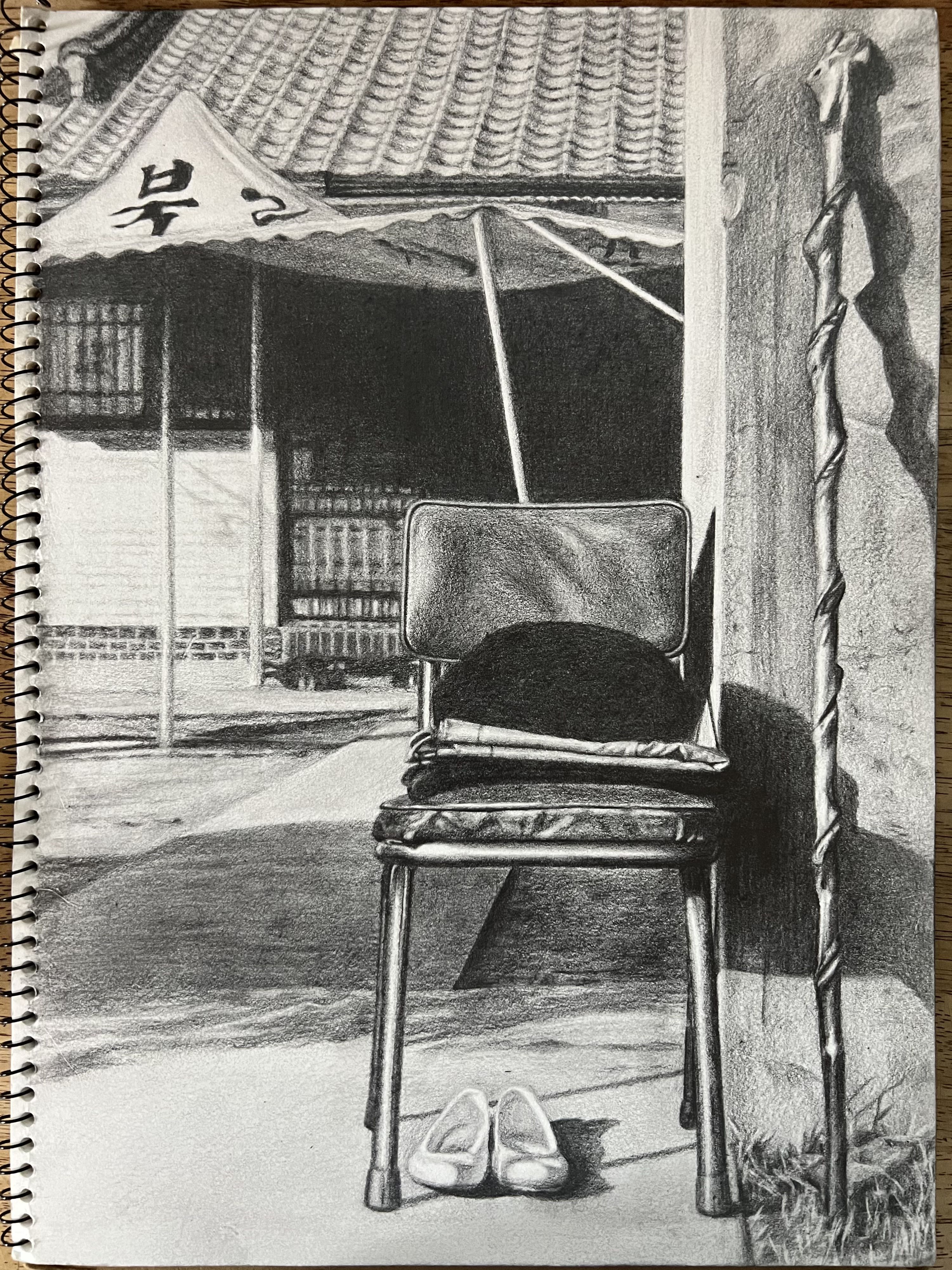티스토리 뷰
【전강선사田岡禪師 법문法門 304번】
산중하사기(山中何事奇)냐
청산백운다(靑山白雲多)니라.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취적기우자(吹笛騎牛者)야
동서임자재(東西任自在)니라.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우리 사부대중(四部大衆)들이, 비구(比丘) · 비구니(比丘尼) · 우바새(優婆塞) · 우바니(優婆尼) 사부대중이 이렇게 모였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도(道)를 닦아 나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고. 무량다겁(無量多劫)에 냄(남, 生)이 없는, 생겨냄이 없는, 처음이 없는 우리에 이 마음자리. 우리에 이 심성(心性), 마음 성품 자리. 세상에 이것이 어디 냉겨난 때가 있을 건가. 처음이 없는 이 마음자리, 이 성품, 아, 이놈을 가지고는 세상에 그 지옥(地獄) · 아귀(餓鬼) · 축생(畜生) 삼악도(三惡道) 죄고(罪苦)를 받고, 이렇게 까장 나와서 금생(今生)에 와서 이 몸 얻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몸 얻어가지고 고향 · 부모 · 형제 · 친척 다 이별해버리고는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도(道) 닦는 이, 이 일이, 차사(此事)가, 이렇게 도를 닦아 나가는 이 차사가 얼마나 중대 중요한가. 어떻게 이렇게 만났으며 이러헌 다행헌 이 정법(正法), 이 도량(道場)에 와서 서로 인연(因緣)해서 만나가지고 도를 닦아나가는 대중이여. 범범(泛泛)헌 일인가, 그럭저럭헌 일인가?
참, 아, 사람 몸 하나 얻기도, 바다 속에 거북이란 놈이 솟아 올라와서 냉기(나무) 만난 것 같다고 했는디, 그 큰 바다에 어디 냉기(나무)가 거북 올라 타라고 그때 냉기가 떠서 올 수 있나 어디서? 마침 어떻게 떠 올 수 있어? 다행히 떠 올 수도 있지. 거기에 올라 앉어서 좀 바람을 쐬고, 그 눈 먼 거북이란 놈이 보던 못허지마는 바다 우에 공중에 바람 좀 쐬고 들어간데... 들어갈 텐데, ‘그 눈 먼 거북이란 놈이 나무 만난 거와 같다.’ 아,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지... 허시지 않았어? 「해중지자(海中之字)니라」, 바다 가운데에다가서 글자 쓴 거 같다. 바다 가운데 글자 쓰면 글자가 나타나나? 그대로 없어져번지지? 그런 것 같고, 「저 사왕천(四王天)에서, 하날에서 바늘을 떨트려서 개자씨(겨자씨)에, 저 갓씨, 개자씨에 꾀낀(꼽힌) 거 같다.」 아, 그렇게 말씀허지 않았어? 부처님이 말씀해 놓지 않았냔 말이여.
이렇게 어려운 이 인신(人身) 몸띵이 하나 얻기도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했거늘. 거 어렵지 않겄어? 사람 하나, 몸띵이 하나 얻기가 어렵, 어렵지 않겠어? 쉽겠어? 좀 자세히 생각해보란 말이여. 「일체 준동함령(一切蠢動含靈)이 다 불성(佛性)이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했지, 그것도? 똑같이? 소나 개나 말이나 돼지나 똑같이 있어. 그런디 소나 개 같은 것은 사람 말을 못허니까 짐승이라 그려, 축생(畜生)이라 그려. 허지마는 말만 못했지 그놈이 주인 다 알고 개도 주인 다 알고 그놈이 뭐 갈 줄 알고 올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아, 똑같어. 왜 사람은 사램이로되 벙어리 말 못헌 게 있나? 입을 가지고 말 못허지? 그러면 짐승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똑같은 것인데, 그와 같은 축생취(畜生趣)만 하드래도 그 숫자가 얼만가. 육지에 육축(六畜)만 해도 얼마며 땅 속에서 기어댕기는 동충(動蟲)만 해도 얼마며 또 바다 속에 있는 어족지유(魚族之類)는 얼만가. 날아댕기는 연, 연비충(蜎飛蟲)은 얼만가. 그런 쬐그만헌 깔따구 모구(모기) 같은 것도 저를 잡을락 하면 달아나. 안 죽을라고 달아나고 제 몸띵이 피신(避身)을 헌단 말이여. 똑같은 것이여.
그렇게 많은 그 함령지유(含靈之類), 바대 해(海) 어족지유(魚族之類), 땅 속에 있는 준동지유(蠢動之類), 전부 합해보란 말이여. 사람은 그 가운데에 몇 명 되는가. 세계 숫자를 다 세 보아도 숫자가 다 나오지 않어? 얼마라고 다 나와 있지? 허지마는 이놈으 숫자는 불가사의(不可思議)다, 사의(思議)헐 수 없고 사량(思量)할 수 없어. 계산할 수 없어. 일체 함령동충(含靈動蟲)은. 이놈은 밤낮으로 사방 날라댕기면서 그 교류헌 놈이 그놈이 새끼를 치되 한 놈으 뱃데기 속에서 백 마리도 치고 몇 백 마리도 내놓고 이렇게 막 들애(들이, 몹시, 마구) 내 놓네. 그 몸띵이를, 육축도. 짐승 겉은 거, 벌레 겉은 거. 못된 짐승일수록 더 많이 그 번식(繁殖)을 허네. 사람은 걔우 그 뭐 삼년(3년) 만에 하나썩이나 낳, 낳되 한 두 서너개, 댓개 낳다가 그만이지? 맨 놈으 이... 전부 충사(蟲巳) 뱃데기 속으로 축생(畜生) 뱃데기 속으로 바대(바다) 해충(海蟲) 해어(海魚) 속으로, 그놈으 데 가서 몸띵이 받아나기는 그냥... 그저 응? 말로 헐 수 없는 순식간에 몸띵이를 받아나오고 그저 그만 하루 만에 받아나오기도 허고 이틀 만에 나오기도 허고 며칠 만에 나오기도 허고, 이건 뭐 뭐 당최 말로 헐 수 없다 그말이여.
그리 들어가서 모두 몸띵이를 모두 받아 나오지 사람 뱃 속에 들어가서 사람 몸띵이 그렇게 쉽게 받아나오겄어? 그래서 「백천만겁(百千萬劫)에 난조우(難遭遇)니라」, 백천만 겁에 이 사람 몸띵이 받아 얻어 나오기가 그렇게도 어려우니라. 왜 이렇게 질게 말을 혀? 자세히 해주어야 백히지. 그 관(觀)이 백히지. ‘사람 몸띵이 얻기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 몸을 얻어가지고는 정법문중(正法門中)에 나와? ‘정법(正法)’이란 건 무엇인고 하니, 정법은 생사(生死) 없는 것을 정법이락 햐. 죽고 사는 것이 없는 것을 정법(正法)이라, 우리 부처님에 정법이라. 그래 「속성정각(速成正覺)이라.」 정각을 이루어야 한다. 그 정법정각(正法正覺)은 나를 깨달라야사, 내가 나를 찾아야사 참말로 정법(正法)이여. 나를 깨달지 못허면 정법이 아니여. 그건 중생법(衆生法)이고 사법(邪法)이지. 이런 정법을 만났어.
솨악- 세상사(世上事)를, 부모 · 친척 응? 고향 전부 다 내버리고 정법문중, 정법도량(正法道場)에 들어왔다. 들어와서 정법을 떠억, 공안법(公案法), 참선법(參禪法), ‘판치생모(板齒生毛)’.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냐」, 어떤 게 조사가 서에서 온 뜻이냐? 「판치생모(板齒生毛)니라」, 판때... 판자 이빨이에 털 났느니라. 원 그러헌 말씀이 어디 있어? 판자 이빨에 털 난 뱁(法)이 그 어디 세상사(世上事)에는 맞지 않지. 판자 이빨에 털 난 거 어디 있나 세상에? 판자 이빨이에 털 나는 거 있어? 도대체 세상에는 없는 말이여. 판자 이빨에 털난 건 없어. 허지마는 그 공안법(公案法)에는 ‘판자 이빨이에 털 난 도리’가 있다 그말이여. ‘어째서 판자 이빨이에 털이 났는고?’ 알 수 없는 그 의단(疑團) 하나만 독로(獨露)허며는 의단독로(疑團獨露)에, 알 수 없는 독로에 세상 번뇌망상(煩惱妄想)이 어디 가 붙을 것인가.
옳게 그놈을 응? 잡들이 허고 다롸 나가는 데 가서 무슨 놈에 망념(妄念)이 있어? 없는데. 본래 망념이 어디 있나? 공연히 망념을 모두 지어내고 만들아 내고 괜히 응? 사량해 낸... 낸, 낸 놈이지 어디 사량해 낸 놈이 어디 가 있어? 그 응? 내 마음으로, 내, 내 응? 심성(心性), 내 마음 성품으로 따악 ‘판치생모(板齒生毛)’라, 판때기 이빨에 털 났느니라. ‘어째서 판때기에 털 났닥 했는고?’ 꼭 그 의심(疑心)이다. 다시 그 의심 밖에는 없어. 그 의단(疑團)만 독로(獨露)허며는 견성성불(見性成佛)헌 법, 법이 응? 의단만 독로허면 견성성불 못헌 법이 없어. 견성성불은 정법을 바로 내가 깨달는다 그말이여. 정각(正覺)을 이룬다 그말이여. 정법정객(正法正覺, 정법정각)이 그거여.
그래서 여기 참 오늘 참 어려우신 저 부산에 계시는 송미장 보살님이 오시고, 그 바깥 선생님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고, 오실라고 허시다가 못 오시고. 그, 그 선생님은 내가 법농(法農)이라, 정법이란 법자(‘法’字) 하나 떼다가 법농이라, ‘법 법’자(‘法’字) ‘농사 농’자(‘農’字), 법농(法農)을 짓는다. 법농이라는 것이, 법농이 범사... 법 농사가 무엇이여? 나 깨달르는 법, 정법을 깨달는, 깨달는 법, 속성정각하는 법이지. 또 송미장 그 보살님은 본래 그저 참 일찍이 불명(佛名)을 동산(東山) 큰스님한테 받아가지고 여태까장 그 참 정법을 닦아나오신 가운데에도 또 무슨 인연으로 여까장 오셔서 이름 하나를 말씀 허셔서, 달라고 허셔서 그것도 다 인연뱁(因緣法)이니까, 정법궁(正法宮)이라.
‘정법(正法)’이라는 것은 내나해야 정법, 정각(正覺), 우리 부처님에 확철대각(廓徹大覺), 확철대오(廓徹大悟)허는 그 정, 정각이란 말씀이여. 정법 우에 더 있어? 정법궁(正法宮)이라, ‘궁(宮)’이라는 것은 적멸본궁(寂滅本宮), 내 적멸본궁, 내 깨달는 확철대오 허며는 적멸본궁이 있어. 우리는 지끔 여태까지 내 본궁(本宮)을 찾아보지 못허고 본궁에 들어가보지 못허고 본궁 살림살이를 한 번도 못해봤어. 내 본궁이, 적멸본궁, 그 ‘집 궁’자(‘宮’字), 그 본궁은 생사 없는, 죽고 사는 생사(生死)가 없는 해탈본궁(解脫本宮)이여. 해탈 본궁살림을 못했다 그말이여. 정법궁이라, 이렇게 지어서 두 어른네의 불명을 짓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계(戒)를...
그 화두(話頭) 드리는 것이,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ㄴ고?’ ‘판치생모(板齒生毛)니라’, 판때기, 판자 이빨이에 털 났느니라. 그 화두 받는 것입니다. ‘판자 이빨이에 털이 나다니. 어째서 조주(趙州) 스님은 판자 이빨이에 털이 났닥 했는고?’ 요것 하나만 늘 거각(擧却)해서, 인자는 아마도 그저 청춘시대 지나가고 한참시대 지나가고 노년시대, 인자 노년기(老年期)가 오셨으니 이거 밲에 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량, 한량 없는 다겁(多劫)으로 여태까지 나를 몰랐으니 나 찾는 법, 속성정각하는 법, 판자 이빨에 털난 도리, 꼭 이것만 거각을 또옥 해나가시다가 정정 잼(잠)이 오고 망생(망상)이 일어나거들랑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옴 마니 반메 훔」을 한 몇 백 번 내지 천 독(千讀)도 좋고 막 불르시어. ‘옴 마니 반메 훔, 옴 마니 반메 훔, 옴마니...’
「옴 마니 반메 훔」이 육자(六字)가 까닭이 있어. 「옴 · 마 · 니 · 반 · 메 · 훔」, 이것이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육근(六根)이, 우리, 우리 육근이, 그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이 육적(六賊)인디, 여섯 도적놈인디 육진육근(六塵六根) 여섯 띠끌을 이루고 여섯 띠끌을 이루는 것은 여섯 망생(妄想)이 모도 일어나서 별별 중생망념(衆生妄念)을 다 응? 눈 귀 코 입 뜻이 다 달지마는(다르지만) 내나 한, 한 놈이지마는 이놈이 여섯 분별(分別)이 모도 갈라져 맡아가지고 귀는 듣는 놈을 맡고 코는 냄새 맡는 놈을 맡고 입은 말허는 놈을... 맛 보는 놈을 맡고 뜻으로는 생각하는 놈을 맡고, 모도 요런 놈이 다 저 각기 맡은 책임이 있어가지고는 여섯, 여섯 응? 육근, 여섯 뿌렁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에서, 육근, ‘뿌리 근’자(‘根’字). 눈 뿌랭이 · 귀 뿌리 · 입 뿌리 · 뜻 뿌리, 모도 그래서 인자 그 뿌랭이에서 육진(六塵)이 되아, 여섯 띠끌을 이루어. ‘띠끌 진’자(‘塵’字), 그 모도 망상번뇌(妄想煩惱)를 이루아.
거기서 또 도적놈 육적(六賊)이 되아. 귀로 듣고도 돌라올(훔쳐올) 마음, 뜻으로 생각해가지고도 돌라올 마음, 눈으로 봐가지고도 돌라올 마음, 맨 도적놈이여. 육근이 육진 육적이 되아가지고는 이 죄업(罪業)만 퍼 짓는 거여. 중생은 밤낮 죄업만 퍼지어. 짓는 것이 죄업이여. 거족동념(擧足動念)이 죄업(罪業)이여. 마음 내고 또 멸(滅)허고 나고 멸허고 나고 가고 오고 밥 먹고 허니 거 맨 놈으 시은(施恩) 죄업만 짓는 것이여. 죄업만 짓다가 그놈으 지어놓았으니 받으러 간다 그말이여. 죄를 받으러 간디, 어디로 가? 삼악도(三惡道)로 가. 물이 펄펄 끓는 지옥(地獄)에다가 쌂아 죽이는 지옥, 톱으로 썰어 죽이는 지옥, 확탕(鑊湯) 응? 지름(기름)으로 막 때레 끓여서 죽이는 지옥, 거 가서 만 번을 죽이고 만 번을 살리운 지옥고(地獄苦)에 들어가. 금생에 살인 강도는 문제도 아니여. 생전 감옥에 들어간 건 문제도 아니여. 몇 억만겁을 가서 들어앉었어. 그 죄를 받아. 겁(劫)이라는 것은 년(年)이 아니여.
겁(劫)이 팔만사천세(八萬四千歲)를 올라갔다 팔만사천세를 내려온 것을 소겁 일겁(小劫一劫)이락 햐. 팔만사천년. 그러면 팔만사천세 올라갔다가 팔만사천세 내려온 거, 그것을 일겁(一劫)이락 햐. 고렇게 팔십을, 팔십 번(80번) 헌 걸 대일겁(大一劫)이라 그래. 대일겁도 문제가 아니여. 그렇게 그 지은 죄업을 다생 과거에도 지었지마는 금생에도 와 이렇게 지었으니 그놈에 죄, 죄업을 받으러 들어가기를 무간악도(無間惡道)로 들어간다 그말이여. 거그 빠져놓며는 인제 앞으로 육억칠천만년(六億七千萬年)을 지내도 못 나와. 그 지옥고(地獄苦) 받니라고. 허니 육억칠천만년(6억 7천만년) 후에는 미륵존불(彌勒尊佛)이 출세(出世)허는데 참여(參與)헐 수가 있이야지? 죄를 원청 많이 지어놓았기 따문에 죄 받니라고 나올 수가 있어야지? 못 나와.
허니 어쩌다가 말, 말세(末世)는 말세다마는 이 말세에 이 인신(人身)을, 그렇게 어려운 인신을 얻어가지고는 이 정법문중에 들어와서 이 정법도량에 들어와서 정법을 닦는 학자가 되았냔 말이다. 좀 생각해보지. 얼마나 다행하며 경행(慶幸)하며. 그 육축(六畜) 그 숭악헌 놈으 연비충 뱃데기 속에, 축생취(畜生趣)에... 취에도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앉었을턴데 어쩌다 이 사람 몸띵이 응? 쌀에 잘, 잘 요 방애 찧은 쌀에, 쌀 뉘 하나 볼래야 볼 수 없는 쌀에 어쩌다가 응? 뉘 하나 응? 그 사람, 「사램이 죽어서 사람으로도, 사람으로 죽어서 태어난 것은 쌀에 뉘 같고, 쌀에 뉘, 쌀 깨끗이 찧은 쌀에 뉘 같고, 저 축생취나 지옥취에 빠진 자는 쌀, 쌀 같다.」 그렇게 말씀 했으며, 「사램이 죽어서 사람 된 자는 지갑상토(指甲上土)요, 이 손톱에 흙 같고, 사람으로도 죽어서 짐승취로 악취(惡趣)로 빠진 것은 대지토(大地土)와 같다, 대지 흙과 같다.」 그랬으니 이 얻기 어, 어려운 몸띵이 이거 얻었지마는 이놈에 몸띵이에 수한(壽限)이 얼만가? 얼마여?
칠팔십 년(70-80년) 산닥하지마는 칠 팔십년 산 사램이 몇 된가? 어릴 때 그저 갓 낳, 낳... 부모 뱃속에 나오자 뒤져버린 것이 얼마며 크다가 죽는 게 얼마며 비명액사(非命縊死)가 얼마며, 그렇게 몸띵이 가지기가 쉬운가? 이렇... 이걸 무생(無常, 무상)이락 햐. 이걸 허맹(虛妄, 허망)이락 하고. 무상한 이몸띵이, 허망한 이 몸띵이, 이 몸띵이 얻어가지고는 팔십 년(80년)을 산다한들 하룻밤 꿈이어늘 그 속에서 어리석게 정법을 믿지 않고, 정법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렇게 죄업만 퍼 짓는 중생(衆生)들. 그, 그 얼마나 응? 참 불행하며 그, 그 미래에 다생(多生) 한량없는 미래의 그 대고(大苦)를, 지내온 과거도 받아왔지마는 미래고(未來苦)를 또 어떻게 헐 터이냐? 변시신후지고마(便是身後之苦麽), 신후(身後)에 고(苦)를.
이 몸띵이 네 이렇게 죄업만 짓다가 죽는다고 아무 일이 없을 줄 알고 ‘아이고 죽었으면, 어서 죽었으면’ 그래? 안 되아. 그런 법 없어. 참 만행(萬幸)허고 다행한 것을 아침마당 저녁마덩 경책(警策)하고 경행하고 가슴 속에 품고 이렇게 아침마당 똑... 내 이 집 창건(創建)헌 이후 오늘날꺼지 십년(10년)이 벌써 다 되아... 지났지마는 하루나 빠진 법이 어디 있냔 말이여. 요 꼭 비가 오던지 눈이 오던지 대중(大衆)에 누가 하나 빠짐이 있어? 하나도 못 빠지지. ‘왜 빠졌나’ 말할 것도 없이 빠진 법 없어. 요렇게 닦아나가. 분수예경(分數禮敬)을, 부처님께 예경(禮敬)허고 참회(懺悔)허고는 판치(板齒), 판자 이빨에 털 난 놈만 찾아나가.
산중(山中)에 하사기(何事奇)냐,
산중에 무엇이 기특(奇特)허냐? 이 일이 기특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닦아나간 이것이 기특허지 않느냐? 이렇게 안 닦아 나가고 쓸 것이냐? 그저 살생(殺生) · 도독질[偸盜] · 사음(邪淫)질, 그다음에는 거짓말[妄語] · 뀌며대는 말[綺語] · 두 가짓 말[兩舌] 응? · 악헌 말[惡口], 탐심(貪心) 내고 · 진심(瞋心) 썽 내고 · 어리석은 마음[癡心], 어리석은 건 정법을 믿지 않고 죄만 짓는 마음. 나 깨달지, 나를 깨달을 줄 모르고 그저 세상 죄업에만 콰악 얽어 얽혀서 죄업만 짓는 거. 그 열 가지 죄업을 짓는 거. 아침에 참회(懺悔)허지 않았어? 이놈을 참회허고는 다시 짓지 않은 뱁이 있다. 어떤 게 짓지 않는 뱁이냐? 밥만 먹으며는 도(道) 닦는 자리에 앉어서 ‘판자 이빨이에 털 나? 어째서 판치생모(板齒生毛)락 했는고? 판치생모? 판자 이빨에 털나? 세상에 판자 이빨에 털 난 도리가 무슨 도리냔 말이여?’ 허, 나 깨달는 법이고 부처님에 정법을 확철대오 헌 법이고 생사 없는 해탈정법(解脫正法)을 바로 깨달는 법이여.
거다가 해석을 붙이고 요리조리 따져보고 요리조리 서탁동... 응? 사량(思量)해보고. 그런 것 아니여. 조끔이나 무슨 세상사(世上事)를, 사량을, 이치를 붙이면 그건 저 죽는 것이고 불법(佛法) 망(亡)우는 것이고, 꼭 바로 깨달라가지고 인가(印可) 없으며는 그건 견성(見性)을 백번 해... 했어도 소용없어. 그런 스승을 스승으로 찾다가는 큰 일난다 그말이여. 달마(達摩) 스님 말씀에 ‘그러니 공과(空過)치 말아라.’ 「불급심사(不急尋師)면」, 스승을 옳게 만나지 못허고 찾지 못허며는 「공과(空過)니라」, 공연히 지내. 죄업만 지어. 스승을 만났자 그 견성을 못헌 건 스승이 아니여. 외도(外道)락 했으니 외도를 만났으니 외도를 만나지 않는 것만 못혀. 초조달마(初祖達摩)가 이렇게 ‘어서 스승을 찾아라.’ 기맥히지, 그 스승 찾는 법.
_______
내가 공부허다가... 옳게 내가 참말로 무슨 견성 했다는 거 아니여. 허지마는 아, 공부허다가 그 공부허는 사램이 그런 경계(境界)가 나지 않나? 곡성(谷城) 동리(桐裏), 곡성 동리를 넘어가다가 하, 그짜는... 그때는 판자, 판자 이빨에 털 난 화두는 해보지도 못허고 알도 못했고. 세 철(3철)만에 만공(滿空) 스님 회상(會上)에 지내다가, 그 몸에 그만 상기병(上氣病)은 얻어서 코로 입으로 피는 팡 팡 팡팡 쏟으면서 남행(南行)을,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항상 한 서너 철 했지마는 조주무자화두(趙州無字話頭)를 했어. 조주 무자화두가 있으니까. 그 무자화두라고만 해두지.
무자화두(無字話頭)를 허는데, 그 어디 댕긴다고 참선화두(參禪話頭)를 안하는가? 간다고 안허며 온다고 안해? ‘어째서 조주(趙州)는 무(無)락 했는고?’허고... 조주 스님 화두가 제일 많으니까. 모도 조주 스님 화두니까. 조주 스님은 천하 괴팩(괴팍)이여. 조주 스님 당시에는 조주 스님 밑에 학자(學者)가 없어. 어떻게 학자를 거꾸로 다루고 모로 다루고, 만약 계행(戒行)을 가진다고 계행에 집착한 학자가 있으며는 말헐 수 없이 다루아. ‘너 이놈, 개고기 먹어라. 개고기를 먹어야사 도를 닦는다. 거 보신탕(補身湯)이다.’ 안 먹으면... ‘에이고 그 외도다.’ 달아나부러. 그까짓 놈, 그 개고기 먹으라고 헌디 달아난 놈, 그런 게 학자여? 다 쫓아부러. 그래서 현량매구(懸羊賣狗)가 그거여. 조실방(祖室房)에다 ‘매구(賣狗)’라고 써 붙인 게 그거여. 매구, ‘개고리를 판다.’ 그말이여.
당최 학자가 붙덜 못혀. 학자 응? 하나나 둘이나 칠십 명, 칠백 명 대중 다 흩어번지고 학자 둘 남았네. “왜 느그는 안 가냐?” 개고기를 먹으라고 막 퍼돌리니깐, 마지 솥에다 삶아서 퍼 돌리니깐 쏵 달아나버려. 이, 이렇게 학자를 다뢌다 그말이여. 그 달아난 놈이 그놈이 학자여? 모냥이나 보고 내 행동이나 보고. 내가 똥이나 싸면, 금똥이나 싸놓면 나를 믿을까? 그놈들 내가 보통 밥 먹고 똥 싸면 그놈들 다 달아날 놈들 아닌가? 소용없어. 그런 것은 정법 배우는 학자 아니다. 대번 다 그렇게 물, 모도 물려쳐부러. 학자 둘 데리꼬 가리켰다 그말이여. 그 학자 둘은 안 가. “왜 안 가느냐?” “아, 제가 법을 믿었지 무슨 개고기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러고서는 그 조주 스님을 믿어가지고는 확철대오를 했지. 그래서 조주 스님 화두가 그렇게 많은데,
나도 조주 무자를 해나가다가 아, 뜻밖에 곡성 동리 재를 넘어가는데, 도, 노지(징검다리)를 이렇게 훌떡 뛰는데 아, 뜻밖에 노지를 건너 뛰는디 화두가 하나 들어오는디 나도, 나도 분간(分揀)할 수 없이, 『담 넘에 외 따오니라.』 겨울 삼동(三冬)인디 『운무중(雲霧中)에 소를 잃었으니 어떻게 했으면 소 찾겄습니까?』 물으니까 『담 너매 가 외 따오니라.』 아, 이렇게 답했... 답헌 법문이, 고인(古人)에 법문(法門)이 있어. 아, 그놈이 훅! 들어오더니 아, 무자의지(無字意旨)가 확 드러나 버리는디, 또 그때 그 지경(地境)은 얻다가 비유헐 수가 없지. 바다 밑에, 바다 밑에서 연기가 난다고 헐까? 허공에 불이 나니 바다 밑에 연기가 난다고 볼까, 그놈을 바다 밑에, 달은 허공에 있는디 바다 밑에 가 달이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해볼까. 「자소일성천지경(自笑一聲天地驚)이라더니」, 내 웃음 한 소리에 천지가 놀랜다더니 아, 그런 지경이 난다 그말이여, 내가 견성했단 말이 아니라. 이게, 그러지만 ‘이게 견성이로구나’ 싶어.
약인이, 『약인(若人)이 문아서래의(問我西來意)허면 각하녹수암전거(脚下綠水岩前去)로구나』. 이 말 하나 딱 하고는 그날 저녁에 동리, 곡성 동리를, 동리사(桐裏寺)를 들어가서 잠 하나도 오지 않고. 눈을 뜨고 앞을 봐도 그 경계, 뒤를 봐도 그 경계, 옆을 봐도 그 경계, 안 봐도 그 경계, 감아도 그 경계. 이것 참 세상에 이게 견성이로구나. 내가 그 경계는 어떻다고 말할 것 없어. 누(樓)에 거닐다가, 내가 무신 놈으 글을 지었어? 화두만... 누가 말해도 말 한마디 내 참가 안 했으니까. 무신 놈으 말 참가혀, 화두헌 사람이. 그까짓 말 했자 건성으로 듣지 누가 바로 듣나? 그까잇 소리 허거나 말거나. 천인 만인 중에 있다한들 그에 무슨 내가 그 말에 무슨 뭔 소용이 있어. 나는 나 할 일만 하고 있는데. 잠도 안 오고 그 경계가 그만 그 뭐, 뭔 눈을 돌, 돌이킨 곳 마당 그대로 그 뿐이고 돌... 눈 안 돌이키면 없나? 눈을 뜨면 없고 감으면 없나? 앉으면 있고 서면 없나? 하, 이것 참. 잼이고 뭣이고 뭣이 그 앞에 뭐 붙어 있나? 하, 이거.
작야월만루(昨夜月滿樓)다.
창외노화추(窓外蘆花秋)다.
불조상신명(佛祖喪身命)이요
유수과교래(流水過橋來)니라.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아, 글이 그놈이 하나가 나오는디 참 이상허지. 무슨 내가 운(韻)을 봐, 글을 지을 줄 알어. 그 문(文)이 운(韻)이 맞아. 운 뭐 그런 거 상관없지마는 그 뭐 글로 그냥 그놈이 짝으로 그저 글이 하나 나온 놈이지. 꼭 그 자리에서 나온 놈이기 따문에 위조(僞造)없지. 이래봐도, 눈을 돌이켜 봐도 떠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전부, 전부 내 본 경계 속에서 그대로 나온 글이기 따문에 위조 없지. 아, 그놈을 떡 한 수를 지었다 그말이여. 뭐? 내가 내 글을 지어놓고도 또 말이 맥히네. 첫 짝이 뭐? 응? [한 스님: 작야월만루... ]
작야월만루(昨夜月滿樓),
어젯밤 달은 누(樓)에 가득했는데, 지금 나 선 누여. 어젯밤 날... 달 빛은 이 누에 가득했는데,
창외(窓外)에는 노화추(蘆花秋)로구나.
창 밖에는 노화(蘆花) 가을이로구나. 가을 가을. 그 어디 뭐 딴 말할 게 뭐 있나? 어디 딴 것이 있나? 이 정법이락 해서, 해탈법이락 해서 부처님에 응? 무슨 뭐 부처님에 법이락 해서 딴 디 가 있나? 부처님 없는 곧에(곳에) 가서, 세상 없는 곧에 가서 어디 이 산산수수(山山水水) 밖에 가서 뭣이 따로 있나? 어젯밤 달은... 어디 밤낮 어젯밤 달 있고 오늘 밤 달 있고 응? 금월(今月) 고월(古月)이 항상 있는 거 아닌가. 어젯밤 달은 창(窓)에, 어젯밤 달은 이 누(樓)에 가득 달빛은 찼는데, 창외(窓外)에는 노화추(蘆花秋)다, 창 밖에는 그 모도 고인가(古人家) 창밖에는 갈대꽃 가을이다. 그때 가을이니까. 갈대꽃은 피었는데 가을이다. 다른 말 했나?
불조상신명(佛祖喪身命)이다.
불, 부처님과 조사(祖師)가 아무리 정각(正覺)을 이루어서 생사해탈(生死解脫)을 했닥하지마는 여기에 와서는 상신명(喪身命)이다, 명을, 명(命)을 잃었다. 그 동리(桐裏) 그 산골착에 물은 철철철철 다리를 지내는데,
유수(流水)는 과교래(過橋來)로구나.
흐른 물은 다리를 지내가는구나. 아, 뭐 내 딴 말 했나?
일편백운(一片白雲)은 강상래(江上來)
기조녹수암전거(幾條綠水岩前去)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우리 부처님, 우리 부처님께서 별별 말씀이 많이 있지마는 경(經)도 모지라고 입도 모지라고 뜻도 모지라고 별별 말씀을 다 설(說)허시고 별별 뜻으로 이치를 말씀 다 허셨지마는 우리 부처님에 말후구(末後句)가, 최후 말후구가, 격외선구(格外禪句)가 「일편백운(一片白雲)은 강상래(江上來)ㄴ디」, 한 쪼각 흰 구름은 강상(江上)에서 오는디, 기조녹수암전거(幾條淥水嵓前去)냐, 몇 가닥 녹수(淥水)는 바우 앞으로 갔느냐. 그게여. 그게 우리 부처님에 말후구(末後句)여.
내 뭐 별 말했어? 그놈 해놓고는 그 이튿날 밤새우고 뭐 그거 뭔 여하약하(如何若何)를 막론(莫論)허고 견성을 했던지 못했던지, 오전(悟前)에도 스승을 찾는 법이고 오후(悟後)에도 스승을 찾는 법인데, ‘내가 그렇게 화두헐 때에는 만공 스님을 찾아가서 했지마는 내가 인자 이렇게 견성을 했으니 나는...’ -내가 시방 헌 소리여. 견성이 그 견성인지 아닌지 그건 말 헐 것 없고- ‘나가, 내가 견성을 했으니 인자는 내가 또 여기서, -곡성 동리서 제일 가까운 디가 마곡사여- 마곡사(麻谷寺)는 혜봉(慧峰) 큰스님이 계신닥 하니 찾아갈 밲에 없다.’ 혜봉 큰스님을 응? 날 샘서부터 그만 아침밥 그녀러 것 뭐 얻어먹거나 말거나 뱁이고 뭣이고 그 관계없지마는, 그때 내가 거기서 그만 미친 짓을 해놔서 밥도 안 주고 쬣겨나다시피 했다 그말이여. 아, 그때는 뭐 미치고 뭣허고 뭐 말할 게 있는가 그 경계가?
그래가지고는 참 마곡사를 가, 가서 혜봉 큰스님을 물으니까 구암리(九巖里)에 계신닥 햐. 구암리에 가서 대번 들어장짱에 척 가서 누더기 한 벌 걸쳐 입고 스물 서너 살(23-24살) 먹은 응? 내가 그때 그 참 청년시대 아닌가. 가서 절을 한자리 턱 허고서는 물되,
― “무자의지(無字意旨)를 반만 일러주십시오. 무자의지를 내가 다 스님께 요구허지 않습니다. 반만 꼭 일러주십시오.” 뭐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선후(先後)도 없는 말을 툭 물었지. “여하시(如何是) 무자의지(無字意旨) 반(半)입니까?”
글성글성허니 키가 훨쩍 큰 어른이 패철(佩鐵) 하나 타고 머리는 쪽 지루어가지고 그냥 상투처럼 이렇게 요리 휘감고. 참 마누라는 하나 얻어가지고 산, 산디... -늘 법문 내 이 법문 하도 많이 해서 했지만 달러. 까닭 있어 허는 거여. 오늘 아침에 이 까닭이 있어서 허는 것을 깊이 들어야 혀. 이 공안을 내가 판단을 내버려야 후대학자(後代學者)들이 인자 의심허지 않지. 내가 오늘 아침에는 답(答)을 해놓을라고 작정이여. 그 이번에 모도 결집(結集)헌디 다 써넣으라고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헐라고 지금 헌 거여. 까닭이 있어서 헌 거여. 백번 천번 허면 관계 있어?-
원 당최 혜봉 스님 선지식(善知識), 한국에 응? 만공 스님 · 혜봉 스님 어찌 혜(慧)가 날카롭던지 만공(滿空) 스님 · 혜봉(慧峰) 스님 · 혜월(慧月) 큰스님 아주 한국에 그, 그 용성(龍城) 큰스님 이렇게 모도 큰스님이 계시지만, 한암(漢岩) 큰스님 계시지마는, 아, 혜봉 스님이라고 유명헌 아 그런 어른인데, 원 모냥 해가지고 있는 것이 암만 후리후리푸래... 후리후리 허니 크고 키도 잘 생겼지마는 하도 패철(佩鐵)을 하나 차고는 이상시럽게 살면서 마누래를 하나 얻었는디 이빨이 마누래 양쪽으로 이렇게 나왔어. 나와가지고 천하불출(天下不出)이여. 암만 봐도 불출이여. 늘 말했지마는, 아들은 둘 낳 놨는데 잘 나 놨어.
그러지마는 내가 혜봉 스님한테 찾아갈 적에 혜봉 스님 무슨 뭐 모냥을 보고 찾아갔나, 내가 무슨 뭐 패철을 찬 걸 내가 뭐 그걸 보, 모냥을 봤을 것인가. 상투 꽂았으면 무슨 관계 있으며 마누라가 잘나고 못났으면 뭐 관계 있으며 아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것 보러 갔나? 그, 그런 것은, 그 사견상견(邪見相見)은 무너진 제가(지가) 오래여. 고까짓 사견이나 상견이나 가지고 찾아가 그 ‘잘났으니 도인(道人)이다’, ‘말 잘허니 도인이다’, 고따굿 놈으... 개고기를 먹으라고 했으면 내가 먹었지 거기서 물러가?
― “무자(無字) 반(半)만 일러주십시오.”
― “무(無)!”
― “거 반(半)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반을 요구했는데 데체 그렇게 반을 못 일러주십니까?”
― “그러면 수좌(首座)는 어떻게 헐 텐고? 수좌가 한마디 이르소. 여하시(如何是) 무자반(無字半)인가?”
반문(反問)을 척! 무서운 말씀이지. 거다 무슨 딴 소리를 혀? 내가,
― “무(無)!”
거 어떻게 되았을까?
― “『거년(去年) 가난은 가난이 아니여, 거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어서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금년 가난은 참 진(眞) 가난이여, 참으로 가난해서, 추야무(錐也無)다, 송곳도 없다.』ㄱ 했으니, 거 송곳도 없닥 했으니, 거년 가난은 송곳 꽂을 땅만 없지 송곳은 있었는데 금년 가난은 진 가난, 참 가난해서 송곳도 없닥 했으니 『여래선(如來禪) 밲에는 아니라.』 했어. 여래선 밲에는 못된닥 했어. 그걸 여래선이락 했으니, 여래선 가지고는 그 되덜 안혀. 그 조사관(祖師關)이 있어야 하니까. 조사선(祖師禪)이 있어야 하니까. -부처님께서 거렴화시중(擧拈花示衆)이 없고 가섭미소(迦葉微笑)가 없으면 조사선(祖師禪)이 아니여. 요건 내가 한 말이고.- 그 어떻게 했으면 수좌는, 조사선을 일러보소. 송곳도 없닥 했으니, 송곳 없는 곧에 나아가서 여래선이락 했으니 어떻게 일렀으면 조사선(祖師禪)을 바로 이르겄는가?”
내가 대답을 허되,
― “능각첨첨첨사추(菱角尖尖尖似錐)ㅂ니다...” 능각은 첨첨허지마는 응? 능각첨첨첨사추란 말이 있어. 있는데 ‘능각첨첨첨사추’ 그놈을 따다가 “능각(菱角)은 첨첨(尖尖)이지마는 불사탑(不似他)ㅂ니다, 타(他)와 같지를 않습니다.” -고건 ‘불사타(不似他)’라는 것은 불사타도 「타시옥수(他是阿誰)」라고 다 여그 선문(禪門)에 있어. 없는 말 아니여. 있는 말이지만 내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능각(菱角)은 뾰쭉, 능객이라는 건 무엇이 능객이냐? ‘말밤쇠 능’자(‘菱’字)여. 땅에 파며는, 말밤쇠라는 게 파며는 땅에 가서 이 세 뿔따구 난 열매가 있, 있어. 고게 빼쭉허니 열매가 응? 세 간데로 난 게 있어.- “고것이 아무리 뾰쭉허지만 타(他)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렀네.
― 그래 아무 말씀이 없어. 그만 무댑(無答, 무답)이여. 말씀이 없어.
― ‘음, 말씀이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일렀단 말씀이로구나.’ 거기서 옳다 긇다 할 것 없지. ‘바로 일렀으니 아무 말이 없, 없으시구나.’ 이랬다 그말이여.
세상에 그 뒤에 며칠 만이여. 몇 달도 아니고 몇 해도 아니여. 여럿 해 발써 혜봉 스님... 내가 스물 세 살(23살) 먹었을 때인께 시방 얼마냔 말이여. 그 뒤에 아, 내가 시상에, 아무리 공부를 해 봐도 꽉 맥힌 놈이 판차... 판자 이빨에 털이여, 판치생모(板齒生毛)여. 입야타불입야타(入也打不入也打), 뭐 뭣 유안석인제하루(有眼石人齊下淚) 무언다... 암차, 암차허(無言童子暗嗟噓, 무언동자암차허), 무언 대답이고 만공 스님한테 다해도 아, 대답을, 쉬흔(50) 문답(問答)을 내가 다... 끝에 마지막 백지 네... -늘 내가 법문 했으니까 들은 사람들은 알지. 처음 듣는 이야 또 다 말 했던들 쉬흔 문답 뭐 알 수 없응게 그만 두고- 백지(白紙) 네모진 데 한쪽 귀퉁이에다가서 원상(圓相, ○) 그려놓은 것 까장 답을 다했거든.
다 해놓고 나서 항상 아이 판... 인자 어쩌다가 거 누 물도(묻지도), 누가 물도 않지. 하도 그 화두는 하도 조주 스님 화두지마는 제일 그 사십이(42) 문댑인가 사십칠(47) 문답인가 그 있지? [염송(拈頌)]에. 아, 그렇게 쉽게 첫들메(첫들머리에, 입구에) 해놨지마는 그 화두를 하나 뜰썩도 않네. 내가 염송 보고 발견했지. 한암 큰스님한테 가도 그 화두는 발견도 않고 말씀도 없지, 만공 큰스님도 없지, 혜월 큰스님도 없지, 아무도 없으니 아, 나 혼자 의심(疑心)만 콱 났네. 그래가지고 판치생모(板齒生毛) 화두를 내가 참 용맹 가용맹정진(勇猛加勇猛精進)허기를 무척 했어. 그놈을 가지고 애를 무척 썼어. 보통 쓴 거 아니여.
그놈 내가 거그서 참으로 점두(點頭)를 헌 뒤에, 판치생모(板齒生毛)를 그믄 내가 바로 봤다고, 본 걸 봤닥하지 못봤닥 햐? 내가 못 본 것을 학자를 가리키고 앉았어? 판치생모(板齒生毛)를 본 후에, ‘어떻게 했으면 자네는 조사선(祖師禪)을 이르겄는가?’ ‘능객(菱角)이 첨첨(尖尖)이라 첨사추(尖似錐)...’ 참 죽었다 그말이여. 제가 저 죽는 걸 알도 못허고 제가 응? 제 생명 모가지 끊어진 걸 그렇게도 몰랐든가 말이여. 천하인(天下人) 눈을 멀릴뻔 했다 그말이여. 참 모골(毛骨)이 송연(竦然)하지. 아, 왜 암 말도 안했냐 그말씀이여. ‘니가 인제 한 번 증험(證驗)해 봐라.’ 했든 것이지.
거그에, “『거년(去年) 가난은 가난이 아니어서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금년(今年) 가난은 참 진(眞) 가난, 참 가난해서 송곳도 없다』ㄱ 했으니 『그 여래선 밖에 안 된다. 여하시(如何是) 조사선(祖師禪)고, 어떤 게 조사관(祖師關)고?』” 그 물는디, 그 콱 맞는 댑이라아 되아. 그건 안되아. 그렇게 응? 조사관(祖師關)이란 그런 거여. 천칠백공안(千七百公案)이란 그렇게 된 거여. 낱낱이. 문답 뜻을 바로 탁 탁 봐 내야 되고. 그 조사관이여. 어떻게 답을 해사 하지? 언하(言下)에. 못혀? 왜 못혀? 부처님은 석일(昔日)에 동아범부(同我凡夫)제 뭐 부처님인들 달러? 부처님은 누구신데? 부처님도 과거 우리와 똑같했지. 뭐, 뭐 언하에 바로 봐 버릴 일이지. 이렇게까장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었다, 이거 못 일러? 왜 왜 딴 데 가서는 왜 주장, 주장자(拄杖子)를 깔고선 ‘아느냐!’ 여따구 놈으 소리를 해놓고서는 여 와선 아무 벙어리 되아가지고 있나? 한마디 나와서 척! 공경허게 절 딱 하고 일러. 어디 살림살이 때려내...
내가 할 수 없어. 여 뭐 일러놨다한들 뭐 일러놨다고 해서 파설(破說)인가? 이게 파설도 아니지. 내가 한국 선지식 스님네의 칠대 선지식... 육대 선지식(六大善知識)이 ‘달다!’ 소리에 인가(印可) 안했어? 몰라? 다 알지? 들어서도 알고 다 알지. 이 답은 더욱 크지. 또 초당파[燒堂婆, 소당파]법문에, 그 법문은 또 답 내가 안 해 놓았지. 내 인제 다 해놓을라는구만. 결집이 된다면 다 해놔. 고인(古人)에 공안에도 다 있지 않는가? 가 법문 다시 들어. 법문 오늘 아침에 이 법문 헌 것이여. 내가 일러놓을 테여. 응? 이렇게도 지달라도(기다려도) 이르는 사램이 없으니 내가 오늘 저녁에, 내일 죽을런지 뭐 오늘 아침에 죽을런지 알 수 있나? 생명이 응? 부처님 말씀에 호흡지간(呼吸之間)이락 했는데? 내가 못 일러놓고 죽으면 되겄어? 선지식 노릇 허기 어렵다. 참 응? 여하시선지식(如何是善知識)고, 어떤 게 선지식고? 무엇을 보고 선지식을 취(取)허냐 그말이여. 꼭 공안 하나다 공안. 공안답(公案答) 하나여.
‘능객(菱角)이 첨첨(尖尖)이라 불사타(不似他)다?’ 요렇게 일러놓고 견성 했다고 돌아댕길뻔 허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날 믿는 자는 다 갖다가서 마군(魔軍)이, 종자가 모도 마군이,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모도 마군(魔軍)이 종자(種子)를 퍼트리게 번식을 좀 맨들아 놓을 뻔 했지. 내가 참회(懺悔)를 안 할 수가 있어? 발써 내 참회를 늘 허는 이 공안인데, 내가 참회를 허고 내가 일러놓던 못하고 시방 있거든. 그만 큰스님네 앞에는 언제 그만 이를 져를도 없이 뭐 돌아가셨응게 못하고. 그래 내가 제일구(第一句)에 만... 용성(龍城) 큰스님한테 다 알지? 용성 큰스님이 ‘내가 속았다.’ 고 물팍 쳐서 다 한 거 알지? 또 용성 큰스님 허고 만공 큰스님 허고 서로 일러논 것도 내가 “납자(衲子)를 모도 과, 과굴(窠窟)에 죽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헐라는가?” “어묵동정(語默動靜) 여의고 무엇을 이르란 말씀입니까?” 헌 거 다 알지? 또 “달다”ㄴ 놈 그놈 만... 용성 큰스님이 물어서 내가 도장완(都壯元, 도장원) 한거 알지? 그만큼 다 아는데 뭘 의심헐 게 뭐 있나? 만약 그때 ‘여하시조사관(如何是祖師關)이냐?’ 물으셨지? 내 법상(法床)에 내려갈 때에 보일 것이고.
_______
여기에 본래는 본 불명(佛名) 동산(東山) 큰스님 한... 큰스님께서 지은 이름이 선심화 보살님이신데, 어저께 참 여기를 오셔서 그 날은 이렇게 더운 염천(炎天)에 더우신... 이렇게 오신 목적은 그 영감께서 그저 내가 ‘법농(法農)’이라고 인자 이름을 지어드린 선생님, 정 선생님, 부산에 송미장에 계시는 주인 선생님이 그 절을 지으셨는데, 저 지리산(智異山), 지리산 그 참 좋은 그 덕천 내 물(냇물)이 흐르고 내 물 안에 가서 큰 대밭이 있고 대밭 안에다가서 그 절을 창건(創建) 허셨는데 주령(主嶺)이 그렇게 실(實)허게 내려오고 앞에 그 산이 터억 와서 득파(得破)를, 득, 득수(得水)를 해놓고. 참 그렇게 공기 좋고 그렇게 산골착에 가 넉넉헌데다가 절을 ‘입 구’자(‘口’字)로 딱 지어놓으셨는데 참 법(法)다이 지어놓았어.
그래 재목(材木)은 아직 그러이 크게 훌륭헌 재목을 내서 짓던 못했지마는 현대 건물로 그만헌 재목도 어렵지. 그러헌 재목으로써 지어놓고, 앞에는 대로 울타리가 되고 대 밖에 나가서는 대밭 밭에 이런 대가 들입대 커난, 몇 천 평이나 된가 몇 만 평이나 된가, 그 낱낱이 나를 가서 구경을 시기고, 밤나무는 몇 주(株)고 산은 몇 정보(町步)고 다 말씀을 했지마는 내가 잊었어. 허지마는 그렇게 해놓고, 법당(法堂) 깨끗이 부처님 잘 삼불조성(三佛造成)을 해서 모셔 놓고, 앞에 종(鐘)을 거종(巨鐘)을 해서 달아놓고, 종각(鐘閣) 해놓고. 참 잘해놓았어. 그런 정법도량(正法道場)을 그 세상에 속가(俗家)에 속제(俗諦)에 계시면서 어찌 부처님 정법을 그렇게 믿고 절을 지어놓셨는고, 기가 맥히지.
그 절을 창건을 해놓으시고서는, ‘어떻게 해야사 족(足)허게 그 참 선방(禪房)을 해나가고 큰스님을 한 번 모시고 선방 해나가는 것을 내가 보고 죽을꼬?’ 그 원(願) 뿐이셔. 헌디다가 말씀을 내가 뒤에 들었건, 들었거니와 그 지금 참 여기에 오신 마나님께서는 더 신심(信心)이 장(壯)허단 말씀을 들었어. 그 신심이 어떻게 장하다고... 여그 있구만 그 말 나한테 안 해 주었어? 그러헌 두 양주(兩主, 부부夫婦)분이 정법을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거그를 선방을 허실 마음을 딱 가지시고서는 그 원을 이루지 못해서 참 한(恨)이여. 한이 골수(骨髓)에 사무치고 맺혔어. 앉어서 들으며는 늘 그 말씀 뿐이고 뿐이고 헌데, 아, 올라오는 말씀을 들으며는, 나 같은 것은 세상에 취(取)헐 것이 없는데 어찌 인연(因緣)이 그렇게 장했던지 아, 나를 가끔 말씀헌닥 햐.
그러더니 이번에 이렇게 오셨어. 오셔서 인자 앞으로는 꼭 정법도량을 맨드시겄다고 어저께 말씀 헌 걸 내가 듣고, 참 누가 시켜서 헐 수 없고 누가 권해서 헐 수 없는 것이여. 참 잘 그, 그 선생님과 그 여그 마나님과 두 양주분이 참 원성취(願成就)했지. 그 원(願)만 성취(成就)해도 그 「초발심시(初發心時)에 변정객(便正覺, 변정각)이다」, 처음 마음 발헐 때 정각(正覺)을 이룬 것이다. 그 마음으로 된 것이어든. 아, 세상에 왔다가, 「세상에 약무호말선(若無毫末善)이면」, 세상에 조그만헌 선행(善行) 하나만 없어도 「사장하물답명후(死將何物答冥侯)냐」, 죽어서 명부(冥府)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하물며 세상에다가 정법을, 그 응? 정법 응? 거 정법 성취헐 그 정법도량(正法道場), 정법선원(正法禪院)을 만들랴고 허는 원력(願力)이 어떠허냔 말씀이여. 말씀으로 헐 수 없어.
그러니 아, 우리, 우리 도 닦는 도학자(道學者)는 그 소중허게 알고 그런 디 가서 한바탕씩 공부를 한 번 용맹시럽게 해재껴야 한다 그말이여. 인자 가을부텀은 응? 인자 그 보살님께서 원력을 세우시며는 그만 보살님께서 원력대로 성취헐 것이여. 사방(四方)서 모도 ‘아, 그런 선방을 해아?’ 하고 그만 당신도 알 수 없고 당신은 능력도 없고 시방 모르지. 모르지마는 그만 하날같이 모두 떠받쳐 가지고는 사방서 인제 시주(施主)ㅅ님으로 모시고 화주(化主)ㅅ님으로 모셔가지고 시주 화주가 겸림(兼任)해 될 것이여. 그래도 마음 내면 되는 것이여. 그 영감께서는 그만 더 더 인자 조불양화(助佛揚化)를, 마나님이 그렇게 원력(願力)을 발(發)하는디 조불양화를 헐 것이고, 더욱 뒤를 받촤줄 것이고. 아, 그러면 그만 선방도량(禪房道場) 되는 것이여.
그런 신심(信心)이 발(發)허지 못허고 그런 원이 없다면 성취 못헌 것이여. 원(願)에 있고 신심(信心)에 있어. 마음을 그렇게 발허셨으니 인자는 정각사(正覺寺)가 정법도량이 되아, 정법선원(正法禪院)이 되아. 그 우리 학자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무량심(無量心)을 갖촤야겄어. 그런 디를 나가서 참 공부를 한바탕 잘해서 우리 정법도량이 되도록 해야할 거 아니여? 축백천추(祝百千秋)에 정각사선원이락 해야되지, 아, 절만 지어놓고 그냥 내던져번지고 아, 그냥 가신다며는 뭣혀. 그런 폐사(廢寺)가 얼마여. 꽉 차서 썩어진 절이 얼마냔 말이여.
해남(海南) 대흥사(大興寺)에서, 다 알지? 몇 번이나 거그를 정법도량을 맨들라고 본말(本末)이 회의(會議)를 다하고 그 나지도 못헌 전강(田岡)을 그렇게 청(請)해갈라고 그렇게 왔지마는 그 내 마음이 발(發)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가지들... 가, 가지, 가지덜 안해. 마음이 가야할 턴디. 허도하도 못해서 갈라고만 하면 병도 나쌓고. 뭣이, 도량은 한국지제일(韓國之第一)이여. 무엇이 못 가느냐? 그놈으 디 원청간 쑥 빠진 놈으 데 나아가서 관청패(官廳牌)가 들어오며는 관청 교제(交際)헐라 내가 늙은 사램이 헐 수가 없어. 독약 먹고 부댐이, 뱃속에 그만 부담이 채이듯기 그거 헐 수 할 수 없어, 아무리 생각을 내봐도 안 나. 넉넉헌 사찰(寺刹) 거 응? 일년, 일년(1년)에 거 무슨 매표(賣票)만 팔아도 수 천만 원 성금(誠金)이 들어오니 넉넉허고 부(富)헌 사찰이지마는 그놈으 관청 걷이만 허고 무슨 짓을 허겄어? 안 허며는 대번에 욕 먹고. 헐 수 할 수 없어서 그런 핑계는 안 했지마는 법문(法門) 한 번 해서 끝을 딱 잘라버리고 나왔다 그말이여. 저번 내 갔다 안 왔어?
내가 여그는, 여기 참 이 큰... 저 선생님이 정법... 법농선생(法農先生), 법농선생이라고 지었어. 법농(法農) 선생과 정법궁(正法宮) 보살님 두 어른네의, 두 어른네의 원력과 그 신심에 내가 그 “그렇게만 원, 원(願)만 발(發)허시고 신(信)만 가지시고 허신다며는 가겄습니다.” 내가 그랬어. 모두 인자 그랬으니깐 아, 이러 이러헌 인연(因緣)이 합해지며는 가는 것이지. 나 가며는 내게 와서 지낼라고 헌 학자만 해도 뭐 미어터지지. 인연대로 지내지 거기에 무슨 뭐 그렇게 많이 대번에 무슨, 어디 몇, 몇 십, 뭐 몇 십명 막 가서 지낼라고 헐 것이 뭣이 있어? 식량도 없는디 그렇게 많이 확 거 지낼 수 있는가? 처음에는 차츰차츰 지내는 법이제?
어쨌든지 꼭 알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이, 이 원력과 이 신심만 가지시며는 못헐 까닭이 있겠습니까? 나는 갈 마음을 냈습니다. 냈으나 어디 그 또 세상사라는 것은 이 뭐 늙은 몸띵이라, 나이 팔십(80)이 떡 된 몸띵이라, 칠십(七十)알 희(稀)요 팔십(80)알 성수(聖壽)ㄴ디 성수년(聖壽年)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놈으 나이 만(滿)해부렀으니 어디 뭐 믿기야 믿겄습니까마는, 뭐 어디 똑 팔십(80)이락 해서 조주(趙州) 스님은 팔십(80)에 행각(行脚)을 했는데 어디 팔십 된다고 헐 마음을 안 할 수가, 마음 나는 것을 안 허는 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해놓고... 공자(孔子)님 말씀에 「조문도(朝聞道)면 석사(夕死)도... 가의(可矣)」락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해놓고 저녁에 죽는들 그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한 번 선방 해놓면 되는 것이지.
이러헌 인연이 모아져서 정각사선원(正覺寺禪院)이 앞으로서 잘 될줄 믿기도 허고 두 양, 큰 선... 저 선생님과 정법궁 보살님을 이렇게 잘 원력을 발해서 신심을 갖촤서 원만성취(圓滿成就) 허시기를 바랩니다. 오늘 아침 설법은 마치고.
_______
내가 이 답(答)을 학자를 위해서 안 헐 것이로되 허거든.
그때에 『여하시조사관(如何是祖師關)고, 어떤 게 조사관(祖師關)이냐?』 응? 생각해보라 그말이여. 왜? 학 다리에는 학 다리를 이어야지, 오리 다리에는 오리 다리를 이어 붙여야지, 학 다리에다가서 까마구 다리나 달구 다리나 그놈을 붙여놓면 쓰겄어? 지드란헌 학 다리에다가? 왜 못혀. 조사관이 다른 것인가?
깨달라 놓고 봐. 꿀 딱 먹을 때, 꿀을 따악 먹을 때 여하시, 여하... 어떻게 해사... 그 칡 줄기에 매달랐는, 매달렸는데, 흰 쥐 검은 쥐가 톡톡톡톡 자르고 있는디 천 질이나 된 새암(샘) 언덕에 붙어서 칡 줄에 의지해가지고 달렸는디 그때 마침 꿀이 내려오니깐 꿀 받아 먹니라고 ‘달다!’ 꿀 받아 묵는다. 우리 오욕락(五欲樂)에 착(着)한 애착, 자석 · 처자 · 돈 · 권리 · 명예 모도 오욕에 파묻혀 있는 우리 중생이 시방 그거 아녀? 천 질이나 된 새암 속에 칡 줄에 매달려서 꿀 받아먹고 있제? “아~~~ ” 그놈 달아 꿀 먹니라고 ‘마누래 · 내 자식 · 내 돈 · 내 권리 · 내 명예’ 이거 밲에는 모리고는 그놈 때문에 죄업만 퍼짓고 생사해탈(生死解脫)은 꿈에도 모른다. 거다가 비유헌 거 아닌가? 법이 다른 것인가? 그 꿀 받아 먹을 때 ‘어떻게 했으면 살아가겄냐?’ ‘달다!’ 그것이 장원(壯元)이여. 내가 안 일러놓았어? 그 육대 선지식이 한목 인가 응? 쏟아, 쏟아진 공안 아니여? ‘달다!’
이것은 여그 이 대중이 듣고 함부로 사방 퍼 놔서는, 퍼 내롸서는 안 되아. 응? 이거 뭐 내가 인자 한국의 바로 내 믿는 선지식이 바로 있다며는 내가 그 탁마(琢磨)를 바로 해야 헐 텐디 더 없으니까 허도 못허고 나 혼자 내 속에만 쟁여놓고. 또 그거는 어쨌던지 말았던지 내 상좌(上佐)라고 헌 말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본 사램이니까. 하나 있어, 하나. 꼭 있어. 하나 내가 바로 전통 하나 있어. 부처님인들 어디 많았나 당시의? ‘가섭미소(迦葉微笑)’ 하나 밲에 더 있었는가? 거그 아란존자(阿難尊者)까장도 못했는디? 하나 있어. 하나 있는디 그 사람은 그게 원청 은퇴(隱退)허기를 좋아하고, 물러가면 어데 가 숨어부러. 그러니까 많은 학자를 위해서 헐런지 안 헐런지는 알 수가 없으나 너무 원통해. 나왔으면 좋으련마는 또 은퇴를 해부렀어.
뭐 별 수 있어? 고인(古人)들도 평생에 입안... 견성해가지고 평생에 입 안 벌리고 만 분도 있고, 아침에 성불해가지고 저녁에 이별해버린 이도 있어. ‘아이고, 이 법을 가지고 중생교화? 못헌다.’ 그만 저녁, 저녁에 돌아가신, 뭐 가셔버린 이도 있어. 그 마음대로 하니까. 뭐 뭐 생사를, 견성을 해가지고는 사무애(事無礙)를 증(證)해버리며는 거기에 뭐 뭐, 뭐 뭐 있나. 뭐 마음? 그까잇 뭐, 뭐 숨 한 번 들이쉬면서 가기도 허고... 숨 한 번 내, 내쉼서 가기도 허고 들이쉼서 오기도 허고. 생사자재(生死自在)라, 죽고 사는데 자재해부렀으니 말할 것이 있는가? 인생이 요까짓 것이 인생이여?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도 모르고 오는 곳 갈 곳도 모르고 뒤지며는 소가 될지 말이 될지 개가 될지 벌거지가 될지 구렁이가 될지도 모르고 앉어서 이게, 이게 인생(人生)이여? 인생이, 「만물중인위최귀萬物中人爲最貴」라는 것이 뭣이여? ‘유인(唯人)이, 오직 사람이 최귀(最貴)다.’ 사람되아가지고 사람 면목(面目)을, 낱낱이 내 면목을 내가 깨달라 생사해탈 문제를, 생사를 해결해야, 해탈해야 아, 그것이 인생... 인생 문제 아닌가, 인생 문제를 해결헌 거 아닌가. 이 공안(公案) 문제.
『어떤 게 조사관(祖師關)이냐?』
『무(無)!』
[주장자(拄杖子)로 법상(法床)을 내려치심]
여그 나오시십시오. 정법궁 보살님 나오십시오. 이 십중대계(十重大戒) 설(說)해서 오늘 아침에 참(懺) 허고, 참회하고. 여기다가 부처님이 스물한 해(21년) 설허신 금강송을... 가만히 계십시오. 조끔 서서 듣고. 여 정식으로 아주 화두와... 화두(話頭)가 그것이 십중대계(十重大戒)니까. 화두를 해사 십중대계를 가지지 그래 안하믄 못 가집니다.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커나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하면
시인(是人)은 행사도(行邪道)라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니라.」
색상(色相)으로 봐? ‘부처님이 인물 잘 나고 삼십이상(三十二相)에 팔십종호(八十種好)를 갖췄으니 부처님이다.’ 그것 소용없다. 고렇게 봐서는 틀립니다. 부처님은 허공에도 잠자고 응? 달도, 별도 달도 갖... 달이나 해나 갖다가 당신 눈에다 붙여가지고 세계를 들이 비춰도 그런 것 가지고는 부처 아닙니다. 생사 없는 법, 생사(生死) 없는 법(法)을 정법(正法)이락 합니다. 요것은 생사 없는 정법송(正法頌)입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평상에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에 화장(火葬)을 허시던지 매장(埋葬)을 허시던지 가슴 속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명(佛名)이 온당헌 불명입니다. 바로 정법궁(正法宮), 본궁(本宮). 고렇게 지었습니다.
거그는, 십중대계는 여기 썼습니다. 제일(第一)에 불살생(不殺生), 제이(第二)에 불투도(不偸盜). 처음에 살생 않고, 제 두체에는 도독질 않고, 세체에는 응? 어디 사음(邪淫)이 있겄습니까? 사음 거 본래 없는 것인게 말할 것 없고, 거짓말 · 꾸며대는 말 · 두가짓 말 · 악헌 말 없고, 넘으 거 욕심 · 뭐 썽내고 썽내쌓고 모략(謀略)해서 아 썽내서 남 죽이기도 허고 별짓 안해?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것은 화두를 잃어버리고 순간이라도 지내면 그 어리석은 겁니다. 판자 이빨에... ‘어떤게 조사서래의냐?’ ‘판치생모(板齒生毛)니라’, 판자 이빨이에 털 났느니라. 고것을 잃어버리고, 고것을 내버리고 그만 그럭저럭 지내가며는, 공안(公案)을 응? 그저 시시때때로 거각(擧却)해야 그 지혜 있는 십중대계를 가진 학잡니다. 요건 십중대계 계목(戒目)입니다. 요래 써서.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니, 보살계(菩薩戒) 뭔 계니, 나는 여기서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똑 전부 신도(信徒) 다 이렇게 드립니다. 이 십중대계만 꼬옥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판치생모(板齒生毛) 화두 받으십시오. 법농 선생도 마찬가지. 그만 들어오십시오. 법농 선생 것 부텀 대표로 머냐 받으십시오. 예, 받고. 여 정법궁, 정법궁.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참 이런 인연이 없습니다.
- 전강선사 법문 304번.
[게송]
○ 산중하사기(山中何事奇) 청산백운다(靑山白雲多)
취적기우자(吹笛騎牛者) 동서임자재(東西任自在)
산중에 무엇이 기특(奇特)허냐? 청산靑山에는 백운白雲이 많다.
피리를 불며 소를 탄 자여. 동서(東西)에 임자재(任自在)하는구나.
○ 작야월만루(昨夜月滿樓) 창외노화추(窓外蘆花秋)
불조상신명(佛祖喪身命) 유수과교래(流水過橋來)
어젯밤 달은 누(樓)에 가득했는데, 창 밖에는 갈대꽃 가을이로구나. 부처님과 조사(祖師)가 아무리 정각(正覺)을 이루어서 생사해탈(生死解脫)을 했닥하지마는 여기에 와서는 상신명(喪身命)이다, 명(命)을 잃었다. 흐른 물은 다리를 지내가는구나.
○ 일편백운강상래(一片白雲江上來) 기조녹수암전거(幾條淥水嵓前去)
한 쪼각 흰 구름은 강상(江上)에서 오는디, 몇 가닥 녹수(淥水)는 바우 앞으로 갔느냐?
[법문내용]
* [인신난득(人身難得), 사람 몸 받기 어렵다.]
- 사람 몸 하나 얻기도, 바다 속에 거북이란 놈이 솟아 올라와서 냉기(나무) 만난 것 같다고 했는디, 그 큰 바다에 어디 냉기(나무)가 거북 올라 타라고 그때 냉기가 떠서 올 수 있나 어디서? 마침 어떻게 떠 올 수 있어? 다행히 떠 올 수도 있지. 거기에 올라 앉어서 좀 바람을 쐬고, 그 눈 먼 거북이란 놈이 보던 못허지마는 바다 우에 공중에 바람 좀 쐬고 들어간데... 들어갈 텐데, ‘그 눈 먼 거북이란 놈이 나무 만난 거와 같다.’
- 「해중지자(海中之字)니라」, 바다 가운데에다가서 글자 쓴 거 같다. 바다 가운데 글자 쓰면 글자가 나타나나? 그대로 없어져번지지?
- 「저 사왕천(四王天)에서, 하날에서 바늘을 떨트려서 개자씨(겨자씨)에, 저 갓씨, 개자씨에 꾀낀(꼽힌) 거 같다.」
- 「사램이 죽어서 사람으로도, 사람으로 죽어서 태어난 것은 쌀에 뉘 같고, 쌀에 뉘, 쌀 깨끗이 찧은 쌀에 뉘 같고, 저 축생취나 지옥취에 빠진 자는 쌀, 쌀 같다.」
- 「사램이 죽어서 사람 된 자는 지갑상토(指甲上土)요, 이 손톱에 흙 같고, 사람으로도 죽어서 짐승취로 악취(惡趣)로 빠진 것은 대지토(大地土)와 같다, 대지 흙과 같다.」
* [정법(正法)이란 건 무엇인고?]
「정법(正法)」이란 건 무엇인고 하니, 정법은 ‘생사(生死) 없는 것’을 정법이락 햐. 죽고 사는 것이 없는 것을 정법(正法)이라, 우리 부처님에 정법이라. 그래 「속성정각(速成正覺)이라.」 정각을 이루어야 한다. 그 정법정각(正法正覺)은 나를 깨달라야사, 내가 나를 찾아야사 참말로 정법(正法)이여. 나를 깨달지 못허면 정법이 아니여. 그건 중생법(衆生法)이고 사법(邪法)이지. 이런 정법을 만났어.
솨악- 세상사(世上事)를, 부모 · 친척 응? 고향 전부 다 내버리고 정법문중, 정법도량(正法道場)에 들어왔다. 들어와서 정법을 떠억, 공안법(公案法), 참선법(參禪法), ‘판치생모(板齒生毛)’.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냐」, 어떤 게 조사가 서에서 온 뜻이냐? 「판치생모(板齒生毛)니라」, 판때... 판자 이빨이에 털 났느니라. 원 그러헌 말씀이 어디 있어? 판자 이빨에 털 난 뱁(法)이 그 어디 세상사(世上事)에는 맞지 않지. 판자 이빨에 털 난 거 어디 있나 세상에? 판자 이빨이에 털 나는 거 있어? 도대체 세상에는 없는 말이여. 판자 이빨에 털난 건 없어. 허지마는 그 공안법(公案法)에는 ‘판자 이빨이에 털 난 도리’가 있다 그말이여. ‘어째서 판자 이빨이에 털이 났는고?’ 알 수 없는 그 의단(疑團) 하나만 독로(獨露)허며는 의단독로(疑團獨露)에, 알 수 없는 독로에 세상 번뇌망상(煩惱妄想)이 어디 가 붙을 것인가.
옳게 그놈을 응? 잡들이 허고 다롸 나가는 데 가서 무슨 놈에 망념(妄念)이 있어? 없는데. 본래 망념이 어디 있나? 공연히 망념을 모두 지어내고 만들아 내고 괜히 응? 사량해 낸 놈이지 어디 사량해 낸 놈이 어디 가 있어? 그 응? 내 마음으로, 내 응? 심성(心性), 내 마음 성품으로 따악 ‘판치생모(板齒生毛)’라, 판때기 이빨에 털 났느니라. ‘어째서 판때기에 털 났닥 했는고?’ 꼭 그 의심(疑心)이다. 다시 그 의심 밖에는 없어. 그 의단(疑團)만 독로(獨露)허며는 견성성불(見性成佛)헌 법이 응? 의단만 독로허면 견성성불 못헌 법이 없어. 견성성불은 정법을 바로 내가 깨달는다 그말이여. 정각(正覺)을 이룬다 그말이여. 정법정객(正法正覺, 정법정각)이 그거여. .....
‘정법(正法)’이라는 것은 내나해야 정법, 정각(正覺), 우리 부처님에 확철대각(廓徹大覺), 확철대오(廓徹大悟)허는 그 정각이란 말씀이여. 정법 우에 더 있어? 정법궁(正法宮)이라, ‘궁(宮)’이라는 것은 적멸본궁(寂滅本宮), 내 적멸본궁, 내 깨달는 확철대오 허며는 적멸본궁이 있어. 우리는 지끔 여태까지 내 본궁(本宮)을 찾아보지 못허고 본궁에 들어가보지 못허고 본궁 살림살이를 한 번도 못해봤어. 내 본궁이, 적멸본궁, 그 ‘집 궁’자(‘宮’字), 그 본궁은 생사 없는, 죽고 사는 생사(生死)가 없는 해탈본궁(解脫本宮)이여. 해탈 본궁 살림을 못했다 그말이여.
* [곡성(谷城) 동리(桐裏) 징검다리에서의 오도경계悟道境界.]
나도 조주 무자를 해나가다가 아, 뜻밖에 곡성 동리 재를 넘어가는데, 도, 노지(징검다리)를 이렇게 훌떡 뛰는데 아, 뜻밖에 노지를 건너 뛰는디 화두가 하나 들어오는디 나도 분간(分揀)할 수 없이, 『담 넘에 외 따오니라.』 겨울 삼동(三冬)인디 『운무중(雲霧中)에 소를 잃었으니 어떻게 했으면 소 찾겄습니까?』 물으니까 『담 너매 가 외 따오니라.』 아, 이렇게 답헌 법문이, 고인(古人)에 법문(法門)이 있어. 아, 그놈이 훅! 들어오더니 아, 무자의지(無字意旨)가 확 드러나 버리는디, 또 그때 그 지경(地境)은 얻다가 비유헐 수가 없지. 바다 밑에, 바다 밑에서 연기가 난다고 헐까? 허공에 불이 나니 바다 밑에 연기가 난다고 볼까, 그놈을 바다 밑에, 달은 허공에 있는디 바다 밑에 가 달이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해볼까. 「자소일성천지경(自笑一聲天地驚)이라더니」, 내 웃음 한 소리에 천지가 놀랜다더니 아, 그런 지경이 난다 그말이여, 내가 견성했단 말이 아니라. 이게, 그러지만 ‘이게 견성이로구나’ 싶어.
『약인(若人)이 문아서래의(問我西來意)허면 각하녹수암전거(脚下綠水岩前去)로구나』. 이 말 하나 딱 하고는 그날 저녁에 동리, 곡성 동리를, 동리사(桐裏寺)를 들어가서 잠 하나도 오지 않고. 눈을 뜨고 앞을 봐도 그 경계, 뒤를 봐도 그 경계, 옆을 봐도 그 경계, 안 봐도 그 경계, 감아도 그 경계. 이것 참 세상에 이게 견성이로구나. 내가 그 경계는 어떻다고 말할 것 없어. 누(樓)에 거닐다가, 내가 무신 놈으 글을 지었어? 화두만... 누가 말해도 말 한마디 내 참가 안 했으니까. 무신 놈으 말 참가혀, 화두헌 사람이. 그까짓 말 했자 건성으로 듣지 누가 바로 듣나? 그까잇 소리 허거나 말거나. 천인 만인 중에 있다한들 그에 무슨 내가 그 말에 무슨 뭔 소용이 있어. 나는 나 할 일만 하고 있는데. 잠도 안 오고 그 경계가 그만 그 뭐, 뭔 눈을 돌, 돌이킨 곳 마당 그대로 그 뿐이고 눈 안 돌이키면 없나? 눈을 뜨면 없고 감으면 없나? 앉으면 있고 서면 없나? 하, 이것 참. 잼이고 뭣이고 뭣이 그 앞에 뭐 붙어 있나? 하, 이거.
『작야월만루(昨夜月滿樓)다. 창외노화추(窓外蘆花秋)다. 불조상신명(佛祖喪身命)이요 유수과교래(流水過橋來)니라.』
아, 글이 그놈이 하나가 나오는디 참 이상허지. 무슨 내가 운(韻)을 봐, 글을 지을 줄 알어. 그 문(文)이 운(韻)이 맞아. 운 뭐 그런 거 상관없지마는 그 뭐 글로 그냥 그놈이 짝으로 그저 글이 하나 나온 놈이지. 꼭 그 자리에서 나온 놈이기 따문에 위조(僞造)없지. 이래봐도, 눈을 돌이켜 봐도 떠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전부, 전부 내 본 경계 속에서 그대로 나온 글이기 따문에 위조 없지. 아, 그놈을 떡 한 수를 지었다 그말이여.
* [여하시(如何是) 조사선(祖師禪)고?]
그래가지고는 참 마곡사(麻谷寺)를 가서 혜봉(慧峰) 큰스님을 물으니까 구암리(九巖里)에 계신닥 햐. 구암리에 가서 대번 들어장짱에 척 가서 누더기 한 벌 걸쳐 입고 스물 서너 살(23-24살) 먹은 응? 내가 그때 그 참 청년시대 아닌가. 가서 절을 한자리 턱 허고서는 물되,
― “무자의지(無字意旨)를 반만 일러주십시오. 무자의지를 내가 다 스님께 요구허지 않습니다. 반만 꼭 일러주십시오.” 뭐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선후(先後)도 없는 말을 툭 물었지. “여하시(如何是) 무자의지(無字意旨) 반(半)입니까?”
― “무(無)!”
― “거 반(半)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반을 요구했는데 데체 그렇게 반을 못 일러주십니까?”
― “그러면 수좌(首座)는 어떻게 헐 텐고? 수좌가 한마디 이르소. 여하시(如何是) 무자반(無字半)인가?” 반문(反問)을 척! 무서운 말씀이지. 거다 무슨 딴 소리를 혀? 내가,
― “무(無)!” 거 어떻게 되았을까?
― “『거년(去年) 가난은 가난이 아니여, 거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어서 송곳 꽂을 땅이 없더니, 금년 가난은 참 진(眞) 가난이여, 참으로 가난해서, 추야무(錐也無)다, 송곳도 없다.』ㄱ 했으니, 거 송곳도 없닥 했으니, 거년 가난은 송곳 꽂을 땅만 없지 송곳은 있었는데 금년 가난은 진 가난, 참 가난해서 송곳도 없닥 했으니 『여래선(如來禪) 밲에는 아니라.』 했어. 여래선 밲에는 못된닥 했어. 그걸 여래선이락 했으니, 여래선 가지고는 그 되덜 안혀. 그 조사관(祖師關)이 있어야 하니까. 조사선(祖師禪)이 있어야 하니까. -부처님께서 거렴화시중(擧拈花示衆)이 없고 가섭미소(迦葉微笑)가 없으면 조사선(祖師禪)이 아니여. 요건 내가 한 말이고.- 그 어떻게 했으면 수좌는, 조사선을 일러보소. 송곳도 없닥 했으니, 송곳 없는 곧에 나아가서 여래선이락 했으니 어떻게 일렀으면 조사선(祖師禪)을 바로 이르겄는가?”
― 내가 대답을 허되, ..... “능각(菱角)은 첨첨(尖尖)이지마는 불사탑(不似他)ㅂ니다, 타(他)와 같지를 않습니다.” ..... “고것이 아무리 뾰쭉허지만 타(他)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렀네.
― 그래 아무 말씀이 없어. 그만 무댑(無答, 무답)이여. 말씀이 없어.
― ‘음, 말씀이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일렀단 말씀이로구나.’ 거기서 옳다 긇다 할 것 없지. ‘바로 일렀으니 아무 말이 없, 없으시구나.’ 이랬다 그말이여.
..... 판치생모(板齒生毛)를 본 후에, ‘어떻게 했으면 자네는 조사선(祖師禪)을 이르겄는가?’ ‘능객(菱角)이 첨첨(尖尖)이라 첨사추(尖似錐)...’ 참 죽었다 그말이여. 제가 저 죽는 걸 알도 못허고 제가 응? 제 생명 모가지 끊어진 걸 그렇게도 몰랐든가 말이여. 천하인(天下人) 눈을 멀릴뻔 했다 그말이여. 참 모골(毛骨)이 송연(竦然)하지. 아, 왜 암 말도 안했냐 그말씀이여. ‘니가 인제 한 번 증험(證驗)해 봐라.’ 했든 것이지. .....
내가 일러놓을 테여. 응? 이렇게도 지달라도(기다려도) 이르는 사램이 없으니 내가 오늘 저녁에, 내일 죽을런지 뭐 오늘 아침에 죽을런지 알 수 있나? 생명이 응? 부처님 말씀에 호흡지간(呼吸之間)이락 했는데? 내가 못 일러놓고 죽으면 되겄어? 선지식 노릇 허기 어렵다. 참 응? 여하시선지식(如何是善知識)고, 어떤 게 선지식고? 무엇을 보고 선지식을 취(取)허냐 그말이여. 꼭 공안 하나다 공안. 공안답(公案答) 하나여. ‘능객(菱角)이 첨첨(尖尖)이라 불사타(不似他)다?’ 요렇게 일러놓고 견성 했다고 돌아댕길뻔 허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날 믿는 자는 다 갖다가서 마군(魔軍)이, 종자가 모도 마군이, 세세생생(世世生生)에 모도 마군(魔軍)이 종자(種子)를 퍼트리게 번식을 좀 맨들아 놓을 뻔 했지. 내가 참회(懺悔)를 안 할 수가 있어? 발써 내 참회를 늘 허는 이 공안인데, 내가 참회를 허고 내가 일러놓던 못하고 시방 있거든. 그만 큰스님네 앞에는 언제 그만 이를 져를도 없이 뭐 돌아가셨응게 못하고. .....
『어떤 게 조사관(祖師關)이냐?』
『무(無)!』
* 법농(法農) 선생과 정법궁(正法宮) 보살이 조실스님께 정각사선원(正覺寺禪院)을 바침.
* [정법송(正法頌)]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커나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하면
시인(是人)은 행사도(行邪道)라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니라.」
..... 평상에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에 화장(火葬)을 허시던지 매장(埋葬)을 허시던지 가슴 속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 一切物中何者爲貴. 諸臣答言 唯人最貴. 王言 人爲最貴 應得多價 云何不售. 諸臣答言 人生時雖貴 死爲最賤 人頭尚無有欲見 況當有買者.
- 『阿育王傳』 七卷.
ᅠ
ᅠ
ᅠ
ᅠ